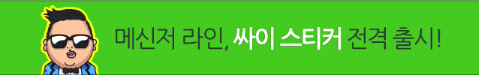- 이광희의 풀꽃이야기-5월 첫 주
- 이광희 숲해설가2013-04-29 오전 07:34:00
- 연두빛 향연 속으로 빠져들다.

세상이 온통 연두빛입니다.
마른가지에 연둣빛 봄바람이 불어오면 세상은 그냥 연두가 됩니다.
푸릇한 새 생명 잉태한 들녘 가득 산 빛부터 연두로 물들고 이내 물빛도 눈빛도 연두가 됩니다.
이제는 밤이건 새벽이건 피부에 닿는 바람이 차갑지만은 않습니다.
이내 달뜬 기분 저기 어딘가에서 누군가 손짓하며 이리오라는 느낌입니다. 그이가 봄 처녀 일까요?
싱숭생숭 거리는 연둣빛 마음가짐으로 봄 느낌 넘실대는 풀꽃들의 향연을 느껴보세요.
봄맞이꽃
꽃샘추위가 가실 즈음 들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봄맞이꽃이랍니다. 보춘화라고도 합니다. 봄맞이꽃을 만날 때면 본격적인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겁니다. 앵초과의 아주 작은 풀꽃이라서 발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워낙 많은 개체수가 무리지어 피어오르고 이들의 전략은 그 옛날 중공군의 인해전술처럼 여기저기 마구 피어오르니까요.
작고 앙증맞으면서도 도도하고 순결한 모습의 풀꽃입니다. 이름도 참 잘 지었지요. 이맘때 들녘에서 이 녀석을 만나는 날은 참 기분 좋습니다. 걸어서 출근하는 아침 무심천변에 걷는 내내 마치 나만을 위해 방긋 웃어주는 그 느낌으로 오늘 하루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습니다.
봄맞이꽃, 굿 모닝~
남산제비꽃
흰제비꽃과는 잎이 전혀 다릅니다. 코스모스잎 같죠? 서울 남산에서 처음 발견돼 보고됐다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답니다. 봄비내리는 날 이 녀석을 만났습니다. 옛날에는 깊은 산속이었을 장소가 최근에는 도로가 생기고 건축물도 세워지고 하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진 곳이 많지요. 오래전에는 산속 깊은 골에서나 만났을 남산제비꽃을 이제는 수련관이며 휴양림 뒷동산 어귀에서 만난답니다.
제비꽃의 끈질긴 생명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악착같은 삶이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꽃송이를 깊은 산속 오가며 만날 때마다 미소 짓게 하는 녀석이에요. 눈 속인 봄비 맞으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군요.
수수꽃다리
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식품으로서의 꽃에서 자연친화적 식용 꽃으로, 꽃의 유효 성분과 향을 활용한 화장품과 향수로, 공기정화 기능을 강화한 환경정화용 꽃,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원예치료와 아로마 테라피 까지, 여기에 기존 패션의 기능이었던 전시와 축제, 공간디자인과 조경으로서의 꽃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러한 꽃의 수입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불액은 장미가 송이 당 1,000원에서 1,400원 가량, 거베라와 난이 한 주당 500~700원 등으로 2009년 전체 로열티 지불액은 13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OECD국 평균 국가별 꽃 소비량으로 따지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8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추세에 있으며 현재 생산규모는 약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품종개발 경쟁이 전쟁처럼 치열해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때에 요즘 같은 봄날 피어오르는 라일락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북한산 백운대의 수수꽃다리라는 종자가 미군에 의해 1954년 미국으로 건너가 ‘미스킴 라일락’으로 원예종 품종개량 된 이후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장악하더니 지금은 한국으로 역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종자 보존과 개발에 매진해야 할 때이지요. 아름다운 꽃놀이를 다녀보면서 문득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즐겨야할 꽃 축제 대신, 우리 것만으로 경쟁력을 가진 우리품종 꽃동산을 꿈꿔봅니다.
귀룽나무 꽃
귀룽나무는 큰키나무입니다. 동네 뒷산이든 깊은 산이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친근한 나무입니다. 봄이 오면 가장먼저 새순을 틔우고 이내 하얀 꽃을 피워냅니다. 한국사람들의 문화는 "빨리빨리문화"라고 하지요. 바로 이 귀룽나무가 빨리빨리의 대명사랍니다. 가장먼저 연둣빛 잎새를 내밀고 빨랑 꽃을 피워내지요. 그리고는 빨리 열매를 맺고 여름이 갈 무렵 찬바람불면 가장먼저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그냥 마른가지로 남는 겁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늘 빨랑빨랑이랍니다. 사실은 다른 나무 꽃 피워내기 전에 벌 나비를 불러 모으고, 다른 녀석들 아웅다웅 햇빛 경쟁할때 이미 홀로 한해 키워나갈 줄기며 뿌리 다 키우고는 짐짓 여유를 부리며 가을과 겨울을 나는 거지요. 그래서 귀룽나무를 닮는 게 경쟁체제에는 좋을 듯도 합니다.
까마귀밥여름나무
빨간 열매가 더 매혹적인 "까마귀밥여름나무"랍니다. 이른 봄에 꽃이 피어나는데 이 꽃이 참 볼품없어요. 이름으로는 까마귀가 좋아할 것 같은 열매(열음-여름)를 달고 있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이라 예상하지만 웬걸, 막상 피어있는 꽃모양은 아름다운 열매에 비해 실망 그 자체 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까마귀밥여름나무가 피어있는 근처에는 벌 나비가 참 많이 보입니다. 향기가 근처 일대를 뒤덮거든요. 꿀 향기 가득한 숲속 무리지어 피어나는 까마귀밥여름나무, 이름을 누가 이리도 예쁘게 지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까마귀밥여름나무를 검색해보면 옻독 오른데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네요. 잎과 줄기를 달인 물을 복용한답니다. 풀과 나무들도 "상생"하거나, "상극"하는 녀석들이 공존하는 세상, 전체적으로는 조화롭다는 이야기겠죠.
당단풍나무 꽃
우리나라 산야에 자생하는 당단풍나무는 큰키나무랍니다. 흔하게 보이지만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잎으로 붉게 타오르는 산야, 아름답게 수놓는 우리나라 대표 단풍나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단풍나무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언제가 나무의사 우종영 선생께서 "우리나라야 말로 단풍나무의 나라"라면서 "많은 종류와 다양한 단풍색은 세계 최고"라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럴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른 봄 큰키나무에 어울리지 않는 앙증맞은 모습으로 꽃을 피웁니다. 워낙 많은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고, 프로팰러 같은 날개달린 열매로 가을녘 멀리 날아올라 싹틔울 곳 찾아다니다가, 높은 발화율로 쑥보다도 더 작은 싹을 틔우기 시작해 큰키나무로 자라는 거지요. 참 신비스런 당단풍의 일대기였답니다.
배꽃
梨花(이화)에 月白(월백)하고 銀漢(은한)이 三更(삼경)인 제,
一枝春心(일지춘심)을 子規(자규)야 알냐마는,
多情(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조년의 다정가"입니다. 봄밤 잠 못 이루고 두견이 피토하는 울음소린들 이맘을 알 수 있을까, 이 시조만큼 봄을 잘 표현한 시구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심금 울리는 시입니다.
배꽃이 한창이지요. 누군들 보름달 휘영청 밝았는데 하얀색 배꽃은 온 천지에 피어있고 피부에 닿는 봄바람은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행복한 봄밤, 누군가 절절하게 생각나는 사람 하나쯤
온통 뒤숭숭하게 하는 봄밤, 바로 지금이랍니다.
복숭아꽃
복사꽃이라 합니다. 분홍의 꽃 도화동, 도연명은 복사꽃잎 떨어져 흘러내려오는 물길 따라 이상향을 찾아 갑니다. "몽유도원도"에는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본 복사꽃 피어있는 세상을 그려내지요. 이백은 "흐르는 물위에 복숭아꽃 잎 아득히 흘러가는 곳"을 인간세상 밖의 또 다른 세상, 별천지로 그려냅니다. 복숭아꽃 피어있는 세상은 인간의 세상이 아닌 거지요.
복숭아나무는 귀신을 쫒아냅니다. 손오공은 복숭아를 따먹고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고흐는 봄이 오는 환희의 세상을 복숭아 꽃피는 과수원으로 캔버스에 그려냅니다. 복사꽃 활짝 피어있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입니다. 복사꽃 핀 세상을 그리며....복숭아꽃말은 "매력" "매혹"이랍니다.
산철쭉
이른 봄 온 산야를 물들이던 진달래가 질 때 쯤이면, 산철쭉이 그 다음을 이어 피어납니다. 수수하던 진달래와는 비슷하지만 더 세련되고 더 진한 모습으로 상춘객의 마음을 흔들게 합니다. 더욱이 연둣빛 잎새 슬쩍 대비되는 상대적 비례는 꽃잎의 아름다움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독성을 가지고 있어 화전 좋아하는 우리네 꽃 요리 만드는데 진달래꽃에 섞여 들어갈까 조심해야 합니다.
구분하자면 진달래와 철쭉과 산철쭉이 모두 조금씩 다르답니다. 여기에 종류 많은 연산홍까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네 산야 자생하는 종류는 연산홍을 빼놓고 나머지 모두 랍니다. 여기에 꼬리진달래도 있답니다. 두고 보는 것 모두 우리네 산야 아름다운 봄 분홍으로 물들이는 소중한 자원들이에요. 이제 철쭉과 산철쭉이 피어납니다.
솜나물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이른 봄에 피어납니다. 이름그대로 솜 같은 털로 덮여있답니다. 처음 숲해설 공부를 시작하면서 틈만 나면 인근 산을 찾았습니다. 벌써 6, 7년쯤 됐나요. 심지어 출근하기 전 이른 새벽에 일단 근처 산 한 바퀴 돌고 내려오곤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맘때였는지 아니면 더 이른 봄날이었는지 발밑에 피어있는 솜나물을 만났습니다. 새벽안개 피어오르는 등산로 나무계산 사이에 홀로 피어난 솜나물이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예상치 못한 첫인상에 반해 일단 마음부터 보고나서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풀꽃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게는 바로 이 녀석 "솜나물"이 그랬답니다.
봄가을에 피어나는 솜나물은 부싯깃나물이라고도 불린답니다. 부싯돌로 불을 지피던 시절 솜나물의 잎을 말려서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로 이용한 데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네요. 직접 본적은 없습니다만 양성산 오르다보면 요즘 한창이더군요.
으름덩굴 꽃
제가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큰키나무, 중간키나무, 작은키나무로 구분하고 작은키나무 중에서 떨기나무와 덩굴나무로 구별 하는 거죠. 이렇게 소개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이것을 "교목" "관목" 이렇게만 나눠놓는 우리나라 구별법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산을 오르다가 5월 중순이나 되어야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으름 꽃을 보았습니다. 으름 꽃의 꽃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게 생겼답니다. 세 개의 꽃잎과 세 개 혹은 네 개의 꽃술이 달려있고 꽃술 끝은 물기가 있어 촉촉하게 보인답니다. 생긴 모양만으로도 고혹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보는 사람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으름은 ‘우리나라 바나나’라고 지칭하는 열매가 열리죠. 으름열매는 씨앗과 과육으로 되어있어 씨앗을 뱉어내면서 달콤한 과육을 먹습니다. 어린 시절 산골소년 이라면 으름열매 따먹던 기억하나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기억이 없다면 산골소년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으름 꽃을 보면서 다시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