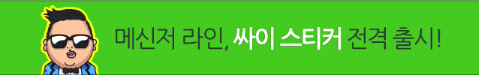- [칼럼] 편이 아니고 팬이 많아야한다
- 고성인터넷뉴스2014-02-17 오전 09:33:37
오늘 저녁도 출판기념회 참석 일정이 하나 잡혀 있다. 그러고 보니 지난해 연말부터 부쩍 이러저러한 출판 기념회가 주위에서 많이 열리고 있다.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솔직히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박수를 쳐주고 싶은 행사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는 이야기다.

▲ 이기철 / 인문학 서재 몯돌 관장. 시인
특히 올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희망자들의 책 잔치가 줄을 잇고 있다. 3월 5일 이전까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단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축하드린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글은 말과 달라서 기록으로 남는다. 내뱉은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질 수 있지만 글은 역사가 돼 고스란히 남게 된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신중함이 요구된다. 글 쓴 이들의 노고를 인정한다.
그러나 요즘 러시를 이루고 있는 출판기념회는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작가들의 출판 기념회는 보통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들이나 지인들이 참석을 한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도 해주고 그 아름다운 잔치에 들러리 서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작가의 ‘팬’(fan)이기 때문이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작금의 출판기념회 풍년은 ‘팬’들의 참석이 아니라 ‘편’ 들의 참석이라는 점이다.
물론 내 편이 있으면 남의 편도 있기 마련이고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출판기념회에서 쏟아내는 내용들이 얼마만한 감동을 안고 있느냐하는 문제다.
무릇 글 쓰는 이들의 마음가짐은 나의 글 한편 한편이 독자들에게 전달될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작가들은 고딕체, 명조체로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물체’, ‘피땀체’로 자신의 글을 다듬어 가는 것이다. 자랑으로서 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글을 읽어 줄 상대를 향한 깊은 애정을 갖고 하는 것이다. ‘자랑체’로 쓴 글은 몇 장 읽지 않아도 뻔하다. 제목만 봐도 감이 온다. 아니 잠이 온다. 외면하고 싶은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낱낱이 공개하는 일이다. 잘 생각해보라. 어쩌면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시인인 필자도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두근거린다. ‘이 글들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작가들은 뻔뻔하지 못한 것이다. 뻔뻔하기 시작하면 글도 따라서 뻔뻔해진다. 그 때는 이미 뒤늦은 상황이 되고 만다.
이른바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 이 행위는 분명히 ‘자기기만’이다.
자기편을 위해 무엇을 하는 행위는 그 파장의 위력엔 한계가 있다. ‘남의 편’도 끌어오게 하는 ‘글빨’이 돼야 한다. 그래서 ‘내 편’ ‘남의 편’이 아니라 모두 ‘팬’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감정상하게 하기는 쉬워도 감동주기는 매우 어렵다.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을 수많은 출판기념회 소식에 귀 기울인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감동 먹을’ 행사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나도 그 누군가의 ‘팬’이 되고 싶은 것이다. 누구의 편이 아니라 ‘팬’으로…
| |
| ▲ 울산/인문학 서재 몽돌 |
이기철 / 인문학 서재 몽돌 관장. 시인
연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