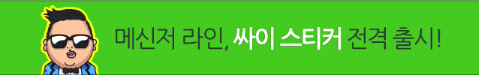- '박경리 선생' 소설 토지의 날어려운 걸음하신 선생의 생생한 목소리
- 고성 인터넷뉴스2007-08-16 오전 9:46:32
뵐 수 없을 것 같았던 토지의 박경리(81) 선생님이 8월 14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소설 토지의 날’ 행사에 어려운 걸음을 하셨다.

▲ 토지문학공원 전시실 앞
요즘 계속되는 궂은 날씨. 이날도 역시 아침부터 빗방울이 오락가락하니 소설 토지의 날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염려 아닌 염려의 목소리를 행사가 진행되기 직전까지 들어야 하는 날이었다.
다행히 선생님이 토지문학공원에 도착하신 오후 5시경엔 수월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늘이 날씨를 다스려주었다.

▲ 왼쪽부터 선생님의 외동딸 김영주. 박경리 선생님. 이계진의원 부인 홍화식
붉은색 저고리, 검은 테 안경을 쓰신 박경리 선생님은 외동딸(김영주)의 부축을 받으며 토지가 집필되었던 옛집에 잠시 들렸다가 꾸며진 무대 쪽으로 자리를 옮기셨다.
사회를 맡은 고창영 토지문학공원 소장은 박경리 선생님께 조금만 앞으로 나오셔서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렸는데 선생님은 극구 불편한 몸을 이끌고 무대 위로 올라 오셨다.

▲ 불편한 몸으로 무대에 서신 박경리 선생님
불편한 몸으로 무대에 올라오신 박경리 선생님은 12분가량의 쉽지 않은 말씀을 해주셨다. 그 내용을 아래에 간추렸다.
“성격상 남 앞에 드러내는 것 좋아하지 않고 또 몸도 많이 불편하고 토지문화관 일도 바쁘고 해서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행사를 주관한 분들의 그 성의가 너무 고마워서 나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 보수적인 사람이라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카드도 핸드폰도 자동차도 컴퓨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펜으로 글을 쓰지 컴퓨터를 이용할 줄 모릅니다. 그것은 한국의 선비들이 갖고 있는 정신을 암암리에 계승하려는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는 꺼려집니다. 토지공원이 만들어질 때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려고 하는 내 성질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외부와의 접촉을 꺼렸어요. 그런 시간이 허비되었다면 그 끔찍하게 긴 ‘토지’라는 작품은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을 절약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일이었고,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작품 외의 글을 쓰는 것입니다. 사담이 들어있는 글, 편지 쓰는 것과 나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땅이나 파고 풀을 뽑고 감자를 캘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 박경리 선생님으로 부터 만화 `토지`에 사인을 받는 아이들
“시대가 너무 자아를 드러내고 있어요. 육체는 너무나 신비스러워 언제 죽는지도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까발린다고 해서 인간의 신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속해집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베일을 씌워 가려 두는 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가치관입니다. 거만하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작가는 작품을 썼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비평은 독자와 평론가한테 맡겨야 합니다. 작가가 주석을 달고 설명을 하는 것은 작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책을 팔아서 살고 있지만, 책이 팔리던 팔리지 않던 나는 작품을 썼을 것인데, 책을 사서 읽는 분들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식물적인 것을 애써서 까발리는 것이 작가가 해야 될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문학공원에 대한 설계를 서울 환경대학에서 가지고 왔을 때 나는 처음에 촌스럽다고 했어요. 저속해 보여서 옆에 지나가면서 들어와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김기열 시장의 말없음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업적 없이 조용히 하나씩 이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 박경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작가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가가 마지못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후학들을 위한 의무감이다. 박경리는 유명해 지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토지문학공원 고창영 소장이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내가졌어요. 그래서 조금씩 자료도 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자를 외면 한 채 끝까지 서서 말씀 하셨다.
다시 박 선생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기에 선생님께 한 마디라도 여쭙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힘들어서 부축을 받으시며 움직이는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선생님을 위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행사장을 떠나시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원주인터넷뉴스 (wjinews@emp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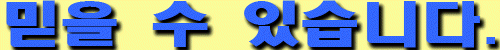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